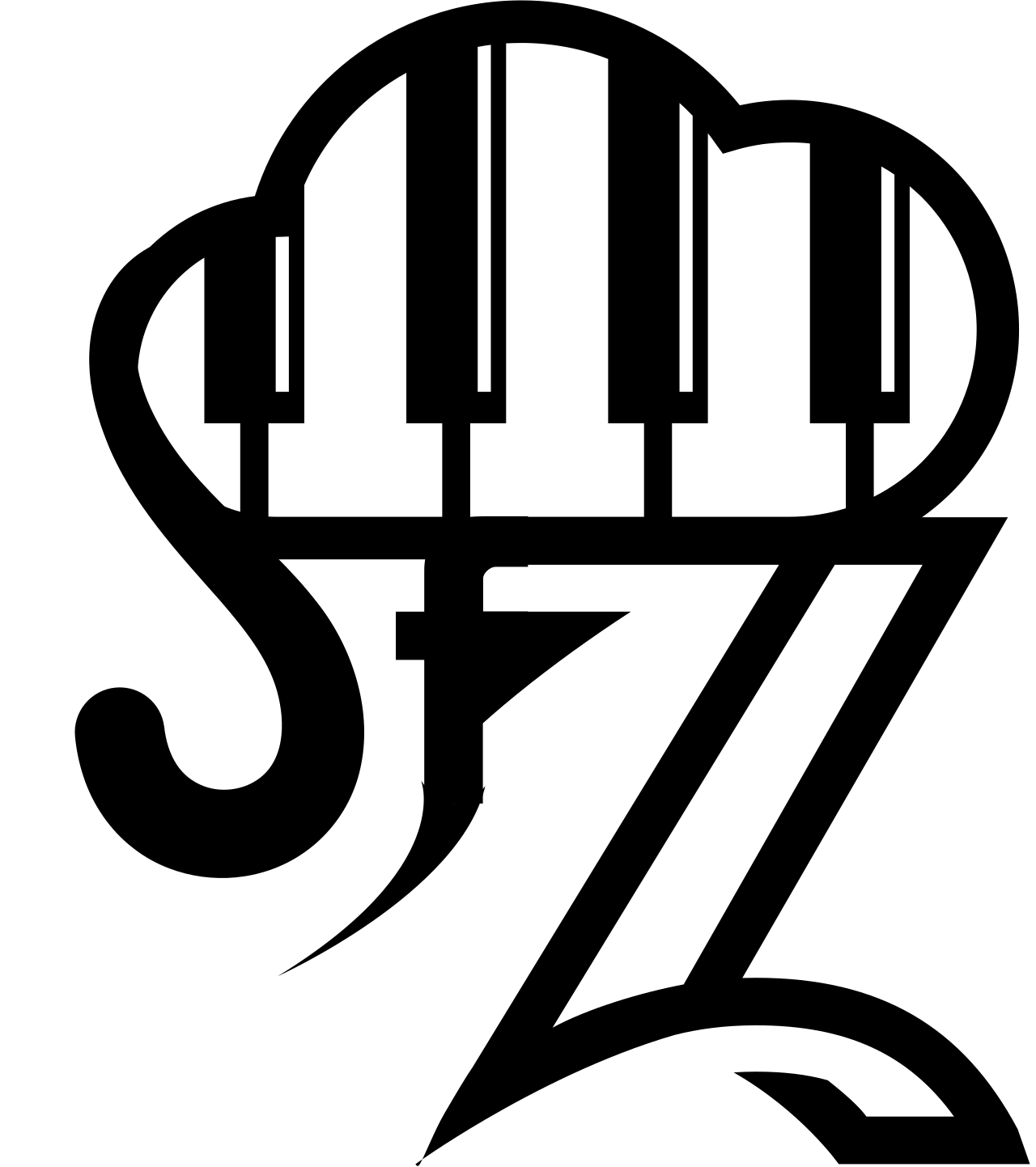June Kim 김정원
Biography
Pianist June Kim is a distinguished collaborative artist who graduated from Yewon School and Seoul Arts High School. She earned her Bachelor of Music degree from Oberlin Conservatory as a scholarship recipient. She went on to complete her Master of Music in Vocal Accompanying at the Peabody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 also on scholarship, and later received a Professional Artist Diploma in Music Coaching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scholarship.
She was a laureate in numerous competitions, including the Eumyeon Competition and Samick Competition. She notably won 1st Prize in the Opera Accompanying category at the Music Journal Competition.
She has performed with the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and performs as a collaborative pianist in opera programs, recitals, and masterclasses. She has served as a rehearsal coach for the regular opera productions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as an adjunct lecturer at both Dankook University an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urrently, she is a piano instructor at Dulwich College Seoul and the director of NovaAnd Management.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버린 음악대학에서 장학생으로 학사 과정을 마쳤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원에서 성악 반주 석사 과정을 장학생으로 마쳤으며,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 코치 전공 예술전문사를 장학금을 받고 마쳤다.
음연 콩쿠르와 삼익 콩쿠르를 포함한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음악저널 콩쿠르에서는 오페라 반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하여, 오페라 프로그램 및 다수의 리사이틀과 마스터클래스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추계예술대학교 정기오페라 연습코치를 역임하였고, 단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바 있다.
현재 덜위치 칼리지 서울에서 피아노 강사로 재직 중이며, NovaAnd Management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
Actually, there is a really funny story.
I started playing the piano when I was 5, and the first time I was exposed to music was when I heard the sound of a piano from a piano academy near a market. I yelled at my mom, saying that I won’t move until she agrees to let me start piano.
That’s the story of how I started playing the piano, but I decided to major in it and started playing it properly around 4th grade. Actually, most people start when they are 8 or 9, so I was a little late.
I won a few awards at school competitions and went to meet a teacher to major in piano. Although I asked for it, I soon didn’t want to do it, so I always skipped classes and ran away, and my teacher came chasing me down.
Then, I naturally found out about Yewon School, and I started building experience in prestigious competitions since I was in 6th grade. With that experience and preparation for the admission exam, I entered Yewon. At that time, I didn't know if I liked music because I was solely focused on the entrance exam.
사실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어.
나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그때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그냥 골목 시장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어. 엄마랑 길을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안 시켜주면 여기서 안 일어나겠다"고 떼를 써서 결국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
그건 단지 피아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전공을 결심하고 제대로 피아노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쯤이야. 사실 보통 사람들은 8~9살에 시작하니까 나는 일찌감치 전공을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편이었어.
그때 학교 콩쿠르에서 몇 번 입상하고 나서야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갔어. 그런데 내가 해달라고 해놓고는 사실 하기 싫어서 맨날 땡땡이치고, 안 가고, 도망 다니고, 선생님은 날 잡으러 오고 그랬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유명한 콩쿠르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경험도 하고 입시곡도 준비해서 결국 예원에 들어가게 됐어. 그때는 무조건 입시에 맞춰서 연습만 하던 시기라서, 사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때였어.
-
I recently went to watch the re-released Amadeus movie. When I was young, I didn't know if I liked Mozart. It was just so, so difficult.
I think the most difficult pieces are those by Mozart and Bach. They look simple, but they're really hard to play well. Also, no matter how much I practice, I can't quite figure it out. It's just so hard.
Actually, I think what I like and what I'm good at are different. What I like changes from time to time, but these days, I like Mozart... I really like Mozart's Requiem although it’s a little depressing.
If it's not an instrumental piece, I also like the opera The Marriage of Figaro. I think those pieces capture Mozart's characteristics well, and reflect the Classical period really well too.
최근에 다시 개봉한 아마데우스 영화를 얼마 전에 보러 갔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내가 모차르트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곡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들이라고 생각해.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잘 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그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많이 어려워.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 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 좋아하는 건 그때그때 다르지만, 요즘은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너무 좋아해.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연주곡이 아니라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도 좋아해. 모차르트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곡들 같고, 그 시대 반영도 엄청 잘한 것 같아.
-
The works I play the best are actually the completely opposite of Mozart: romantic works like Rachmaninoff. I got a pretty high score on my performance exams, and also won a lot of awards at competitions with those pieces. I have good strength for a woman, quite big hands, and agile fingers, so I think I often chose and played those pieces after the entrance exams. Also, it’s much easier for me to express myself musically.
But this changes little by little. Although I can’t say for sure, as one gets older and plays a wider variety of pieces, one would eventually find pieces that fit them well. But even that can change later on.
Overall, I feel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those Romantic pieces, and I think they are the ones I can play most confidently on any stage.
내가 제일 잘 연주하는 건 사실 완전히 대조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야. 그걸로 나는 실기 점수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 콩쿠르 입상도 잘했었고. 여자치고 힘도 좋은 편이고, 손도 큰 편이고,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곡들을 입시 끝나고는 자주 골라서 연주했었던 것 같아. 음악적 표현을 하기에도 나한테는 훨씬 쉬워.
근데 이건 조금씩 변해. 그리고 딱 특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고 연주를 해 볼수록 다양한 시대의 곡을 연주해 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곡들이 생겨. 근데 또 나중에 봤을 때는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대체적으로 연주할 때 마음이 편하고, 어느 무대에서든 가장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은 그런 낭만주의 곡들인 것 같아.
-
It was when I performed a two-piano piece in 2022. There are actually a lot of really good two-piano pieces, but I played the two-piano version of Danse Macabre by Saint-Saëns. I think I played it flawlessly. Also, if I had another chance, I would like to do that piece again. That’s how much I love that piece.
I also remember my performance of Piazzolla's Libertango on two pianos. It was especially memorable because I performed it at Seoul Arts Center. However, it was a little difficult to practice.
Honestly, it resonates with me more when I perform with others, like on two pianos, than when I perform solo.
I don't really care about the venue, but I think how memorable a performance is depends on the piece and how I practiced it.
22년도에 투 피아노 곡을 연주한 적이 있거든. 투 피아노 곡이 사실 엄청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때 생상의 죽음의 무도를 투 피아노로 연주한 적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완벽하게 잘 연주했어. 그리고 기회가 또 있다면 그 곡을 한 번 더 해 보고 싶어. 그 정도로 내가 너무 좋아했던 곡이야.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투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도 기억에 남아. 게다가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해서 더 기억에 남아. 그건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긴 했어.
솔직히 나는 솔로보다는 투 피아노처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주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남아.
난 베뉴를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곡이었고 어떤 연습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
For me, it’s Alfred Brendel, who recently passed away. I had so many recordings of him: Schubert and mostly Beethoven. Especially, it’s because I studied Beethoven the most when I was in middle and high school.
At that time, YouTube wasn’t prevalent, so everyone bought CDs to listen to recordings. Even up to this day, I try to listen to his recordings whenever I can.
I think his performances capture Beethoven’s characteristics really well. I like Beethoven, not his early works, but his middle to later works. I think his interpretation of those works is very neat and just flawless: it feels like the epitome of Beethoven’s works.
However, when I listen to his recordings of Schubert’s works, they’re very different. Still, I prefer his Beethoven much more than his Schubert because the texture in his Beethoven suits me better.
His interpretation is also very interesting, especially his phrasing. For example, he may choose to play two 2-bar phrases, which I might naturally hear as one regular 4-bar phrase. These subtle choices have been very inspiring in studying Beethoven, so he’s one of the musicians I’ve relied the most on.
Of course I didn’t listen to only his recordings, but when I studied the hardest and performed the most, I listened to his the most often, so I feel like I am most influenced by him.
나한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알프레드 브렌델. 그분의 음반이 엄청 많았었어. 슈베르트랑 베토벤이 대부분이었지. 왜냐하면 베토벤 곡을 한창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치게 됐거든.
그때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CD를 다 사서 들었을 때였어. 요즘도 베토벤은 그분 것을 찾아 듣는 편이야.
나는 그분이 베토벤의 많은 특징을 잘 살린다고 생각해. 난 베토벤의 초기보다는 중반에서 후기 곡들을 좋아하거든. 뭔가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냥 대표적인 정석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좋았어.
근데 그 할아버지의 슈베르트를 들으면 또 달라. 난 슈베르트보다는 베토벤 음반들이 훨씬 좋았어. 훨씬 더 베토벤스럽고, 뭔가 그 텍스처가 나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의 해석, 예를 들어 나였으면 4마디를 쭉 갔을 것을 브렌델은 2마디씩 프레이징할 때도 있었지. 이렇게 프레이징을 다르게 하는 방법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부할 때 많이 의지했던 그런 음악가 중 하나야.
물론 그분 것만 고정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연주를 할 때 그 할아버지 것을 제일 많이 들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
I don’t think the so-called “musical inspirations” always come from music itself. When I was music student, I thought those musical inspirations came naturally from music because everything around me was music. But actually, the thing that inspires me the most is just my ordinary daily life.
For example, when I’m walking and I see people talking, arguing, or something like that, sometimes a specific piece comes to mind, or sometimes I think about how I can incorporate and contextualize that experience in my music. When my friends are talking about everyday stuff, some arbitrary inspiration would suddenly strike me and then, I’d try to apply it to my music when I go practice later.
Many musicians go to the mountains or beaches for inspiration. I like that sense of peace from nature, but I apply ordinary everyday noises to my music the best.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음악적 영감이라고 해서 꼭 음악적인 부분에서 받은 적은 잘 없는 것 같아. 한참 막 학교 다니고 음악에 몰두해서 공부할 때는 주위가 다 음악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오는 게 영감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사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은 그냥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야.
예를 들어 걷다가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걸 보면, 거기서 어떤 음악이 떠오를 때도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맥락에 맞게 내 음악에 어떻게 반영해 볼까 생각해 봐. 아니면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뭔가 와서 그걸 내 연습에 적용해 볼까 해.
음악가들이 많이들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기도 해. 난 그런 고요함도 좋지만, 일상적인 평범한 소음 같은 것들을 가장 잘 적용해.
-
This is difficult to answer. Since I’m not left-handed, I usually practice my left hand more than my right hand when I practice. For example, in the case of Chopin’s ‘Revolutionary’ Etude, your left hand has to be very good. I always practice with my left hand first, and when I teach kids, I always make them practice their left hand first. Whether it’s difficult or not, I always start with my left hand.
The right hand often has a lot of melody lines and can be positioned quickly, but that’s not quite easy with the left hand, unless you’re ambidextrous. Therefore, I get my left hand fully trained first, and then I add my right hand in order to gradually start playing a new piece.
When I have to stretch my fingers to play, I habitually move my entire arm and then return to the original position. I tend to practice this with my left hand a lot. Since the spacing between the fingers is different, the timing of the leaps is different. I tend to practice with my arm a lot until I get used to the various timings. The right hand gets used to it quickly, but it’s never been easy with the left hand.
Practicing the technique is fundamental through dotted rhythms and scales. In addition to those, I tend to practice a lot of intervals and timings of my left hand.
I also tend to change the fingerings often. If you compare different music publishers, the fingerings of the same passage often vary, and sometimes, they’re not written at all. I usually practice as written, but if it doesn't suit my fingers, I always change it. If the new fingering doesn't suit me after a while, I change it again.
오, 이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연습할 때 오른손보다 왼손을 정말 많이 연습하거든. 예를 들어 ‘혁명’ 같은 경우는 왼손이 엄청 잘 돌아가줘야 연주할 수 있는 곡이잖아. 난 연습을 항상 왼손부터 하고, 애들 가르칠 때도 왼손부터 연습시키고 있어.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난 무조건 왼손부터야.
오른손은 멜로디 라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금방 포지셔닝이 되는데, 왼손은 그게 쉽지가 않아.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왼손을 먼저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오른손을 더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거지.
손을 뻗어서 치는 부분이 있으면 난 습관적으로 항상 팔 전체를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이걸 나는 왼손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야. 손가락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도 다 달라. 그 타이밍이 몸에 익을 때까지 팔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해주는 편이야. 오른손은 금방 익혀지는데, 예전부터 왼손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손가락 돌리는 테크닉 연습은 붙점과 스케일 같은 것들은 기본이야. 거기에 더해서 왼손의 테크니컬한 이동 포지션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리고 손가락 번호도 자주 바꾸는 편이야. 출판사들을 비교해 보면 손가락 번호가 다르게 써 있거나 아예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거기 써 있는 대로 보통 연습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손가락에 안 맞으면 나는 무조건 다 바꾸거든. 연습하다가 또 안 맞으면 또 바꾸고.
-
Yes. I have a plan, but I don't know if it will work out or not. I have to rent the venue first. I'm preparing for a two piano piece at an alumni concert next year.
Also, I have a concert planned in November, which I’ll be organizing with my friend. I won't be performing, but my friends will.
있지. 계획은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대관이 우선 돼야 돼. 내년에 동문 음악회를 투 피아노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내 친구랑 같이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11월에 하나 예정되어 있어. 근데 나는 연주는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이할거야.
-
As a musician, every day is a challenge. It may not be the case for everyone musician, but every moment of preparation is a challenge, and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difficul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organizing a repertoire, practicing accordingly, and memorizing a piece, all of these moments are challenges.
I don’t think I have experienced the most difficult moment yet.
The extent of the mental hardship may vary for different people, but it would depend on how desperate you were when you went to a competition, which would be even higher if it wa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Also, it would depend on how big the failure was, but I’d say I haven’t experienced the greatest challenge yet, as I haven’t been overly ambitious for those competitions.
I think in music, every moment is meaningful, and you grow as a musician every time.
I don’t think you can overcome challenges. From the moment you enter this field, you have to endure rather than overcome it. Even if it’s hard, you endure it because you love music, and you have to make it to the end and accomplish your goals. I don’t think you can overcome it until you die. I think music is just like that.
음악가로서 매일이 도전이지. 음악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뭘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다 도전이고, 안 힘든 것은 없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퍼토리를 짜고 그것에 맞춰서 연습하고, 외우고, 이 모든 순간들이 다 도전이지.
그중에서 제일 힘든 순간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콩쿨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따라, 국제 콩쿨이라면 더 할 것이고, 거기서 얼마나 고배를 마셨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어서 아직은 없다고 말하고 싶어.
뭘 하는 순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 한순간 한순간 성장한다고 생각해.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아. 이 분야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극복이라기보다 버텨야 돼. 힘들어도 음악이 좋으니까 버티는 거고, 끝까지 해내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극복은 안 될 것 같아. 음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같아.
-
Usually, when students first learn the piano, it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natural talent. When they are just learning the piano for the first time and are complete beginners, they get to a point when they can read both the treble and bass clefs. Then, they run into the first obstacle of having to play both hands simultaneously. That’s when they start to twist their bodies. That’s because they are usually only 5 or 6 years old.
At those times, I give them real-life examples that they can easily come across. For example, when baking cookies, which children love, I compare their current situation to the situation where something doesn’t go well in baking cookies. Also, when a child likes crafting and something goes wrong, I help them think, “What can improve that situation?” If they want to take a break, I let them take a break from piano practice. I think I tend to let my students take breaks like this when they struggle.
However, if they are talented and self-driven, I still let them go and do what they want when they encounter difficulties. However, I think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I let them go. For example, I let them play a different piece. Not classical, but something different like jazz. I tend to call their attention to something else for a while to refresh their minds and then come back. Students usually come back quickly.
Everyone hates practicing. I hated it too, and I used to run away from teachers. If you force them in that situation, they will hate it even more. That’s why, as an educator, you need to be patient and wait. When the students come back and feel motivated, I don’t stop what they were working on, but instead, I change it to something more fun. I let them play the piece they want or something a little less serious.
For younger kids, I tend to use games, for example, sticker games, to make the lesson more amusing and call their attention to something else. Then, the kids start having fun again in lessons. If they fail to enjoy it at that point, they won’t be able to continue playing the instrument anymore, and in fact, I think all instruments are the same in that way.
보통 학생들이 맨 처음에 피아노를 배운다고 할 때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 아예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정도만 되는 초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처음 배우고 나서 높은음자리표랑 낮은음자리표를 읽게 되면서 양손을 동시에 쳐야 할 때 첫 고비가 와. 그때부터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더라고. 보통 5~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다 보니 그래.
그럴 때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줘.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 같은 걸 만들 때 뭔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줘. 또 어떤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 안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될까?' 같은 식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지. 그리고 조금 쉬고 싶어 하면, 쉬었다 와도 좋아. 나는 이런 식으로 쉬어가게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런데 재능이 있고, 음악을 좋아해서 스스로 하려는 경우에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을 놓아주기는 해. 다만, 그 놔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다른 곡을 쳐보게 해줘. 클래식이 아닌 재즈라든가, 다른 쪽으로 잠시 돌려서 환기 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편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돌아오더라고.
근데 연습은 누구나 다 싫어해. 나도 싫어했고, 도망 다니기도 했어. 그런 상태에서 강요하면 더 싫어하게 돼. 그래서 교육자로서 기다려줄 수 있는 참을성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줘. 원하는 곡을 하게 하거나, 조금 가벼운 곡으로 바꿔주는 거지.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티커 게임 같은 걸 활용해서 수업을 게임처럼 해주고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편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재밌게 하더라고. 그 고비에서 무너지면 악기를 더 이상 못 배우는 거고, 사실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을 것 같아.
To stay updated with her musical performances and offstage moments, feel free to explore further here!